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부동산 투기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1967년 최초 부동산 정책인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양도 때 무조건 차액의 50%를 부과) 이후 40년 동안 투기와의 전쟁이 계속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도구, 또 더 나아가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0년대 말 한강 이남인 강남을 개발하면서 새롭게 '복부인'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로 광풍이 시작되었는데, 66년 초 신사동 땅값이 1평에 200원이었던 것이 1년 후에는 1500%가 인상된 3000원을 호가하였고, 5년 후인 71년에는 7500%가 상승한 평균 15,000으로 뛰었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서는 군사정권이 아파트로 경기를 부양하였고 더 많은 복부인들을 낳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당시 복부인들을 ‘빨간 바지’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고위층 복부인들이 즐겨 입고 다녔던 바지 색깔에서 유래되었는데, '떴다방'이나 '파라솔 부대'같은 신종 단어와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는 정부 고위층이나 군 장성 부인 등이 전국적 투기판에 뛰어들어 신도시가 개발되는 개발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단위 토지들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고위층의 전유물이었던 부동산 투기가 90년대 들어서면서 전문화되고 기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정부 도시계획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기에서 벗어나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라는 명목으로 특정 지역의 개발 호재를 만들어내어 일시적 땅값 상승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6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말까지가 고위공직자나 장성들의 부인들인 복부인들이 그 투기의 세력이었다면 90년대에서 2천 년대에 들어서면서는 토지개발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계속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LH 사태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특별히 이 시기에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나 많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들의 누적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부동산 투기의 역사가 보여주듯 우리나라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으로써 분 아니라 여전히 재산 증식과 부자가 될 수 있는 하이패스 정도로도 생각되는, 그래서 전 국민이 똘똘한 1채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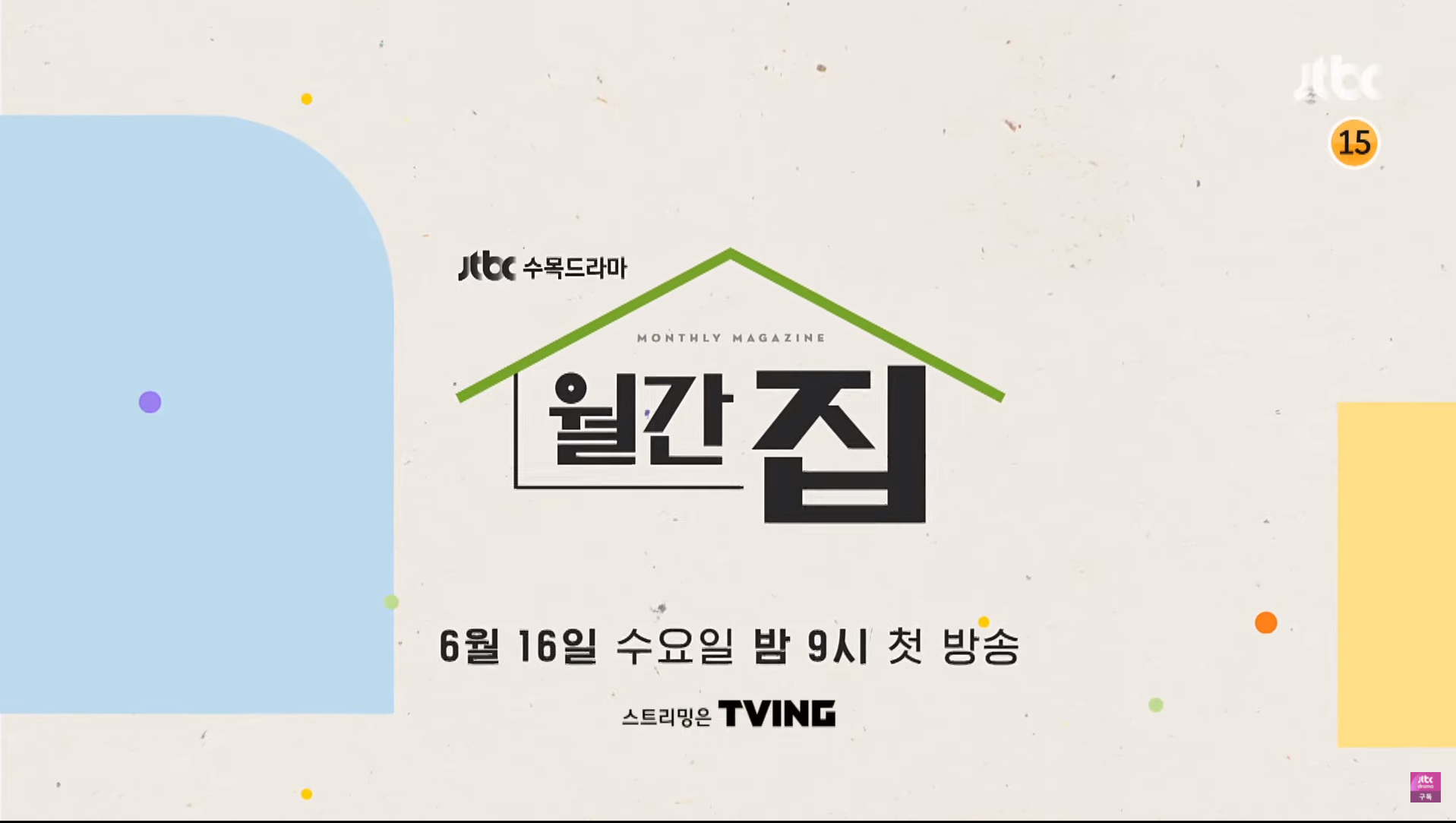
전 국민의 공통 관심인 집.
바로 이 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펼쳐질 JTBC 새 수목드라마 '월간 집'(극본 명수현 연출 이창민 제작 드라마하우스 스튜디오, JTBC 스튜디오)이 새롭게 방영됩니다.
"살고 싶은 집과 사고 싶은 집"
어떤 이는 살기 위해 집을 찾고, 어떤 이는 삶을 만들어 갈 집을 찾고, 또 어떤 이에게 집은 그냥 사고파는 물건이 됩니다.

드라마에서 여주로 나오는 에디터 나영원(정소민 분)은 10년 차 직장인이며 10년간 월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집은 그녀의 모든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추억이 가득 찬 공간으로 그냥 "살고 싶은 집"입니다. 그래서 달력이나 액자, 커튼 등 그녀의 손 갈이 묻어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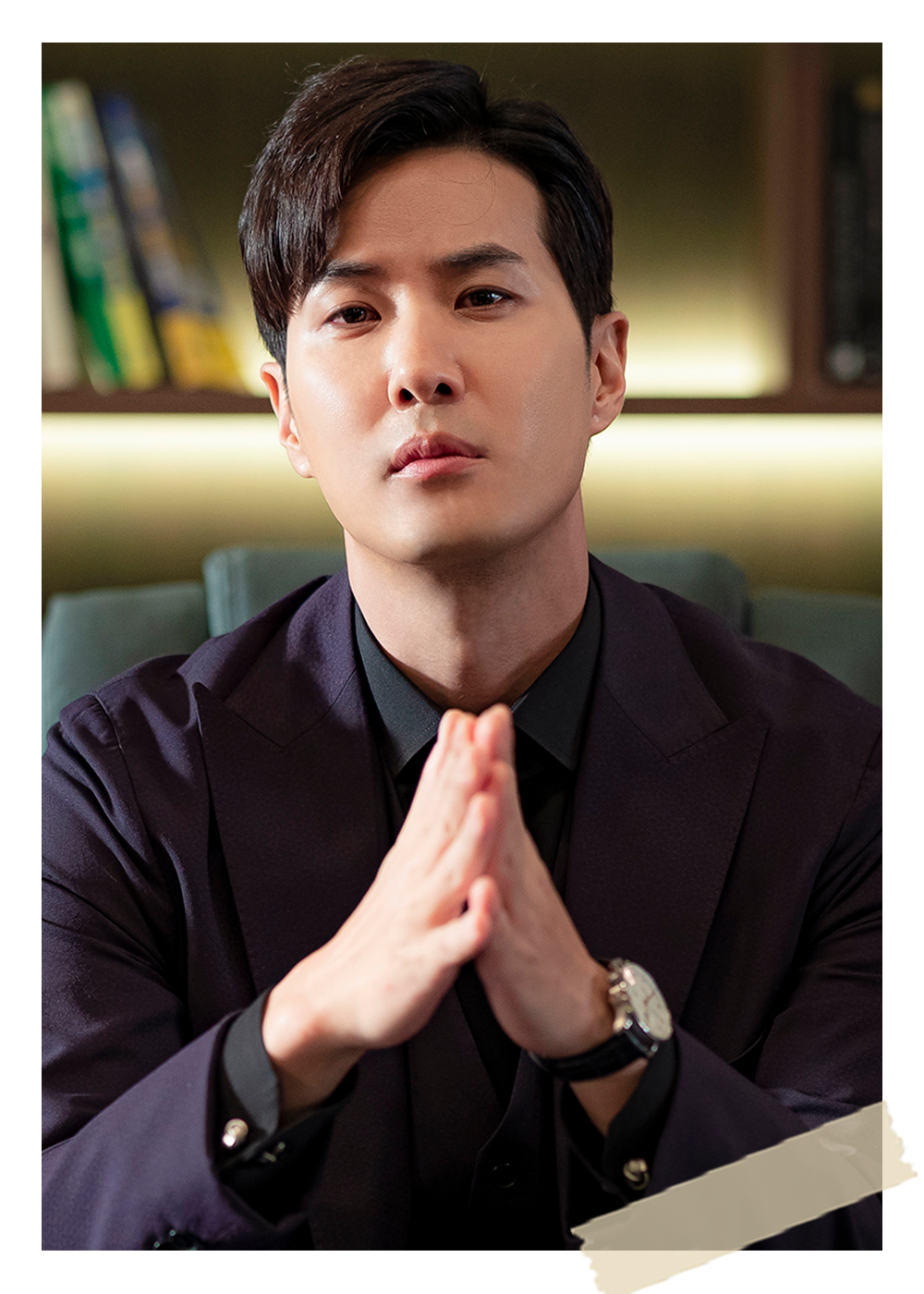
반대로 '월간 집' 대표 유자성(김지석 분)에게 집(House)은 그저 재산증식의 수단이자 잠깐 잠만 자는 곳일 뿐이다. 놀이동산보다 부동산이 더 재미있다고 하는 그는 집이란 부자로 인도하는 수간이고 통로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이라고는 1도 몰랐던 나영원이 유자성을 만나며 자기 집 마련 프로젝트를 벌이는 순간, 드라마에는 또 다른 의미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겸(정건주 분)은 사진작가로 욜로족입니다. 그에게 있어 집은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고정관념이 아니라 그가 머무는 모든 것이 그의 집이라는 생각입니다.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캠핑을 많이 하는데, 텐트를 치고 하루 이틀을 머무는 그곳도 그에게는 집인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디터 13년 차로 월세 100의 럭셔리 자취생인 여의주(채정안)에게 집은 오늘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내일을 위한 부동산 투자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힙한 동네에서 월세 100만 원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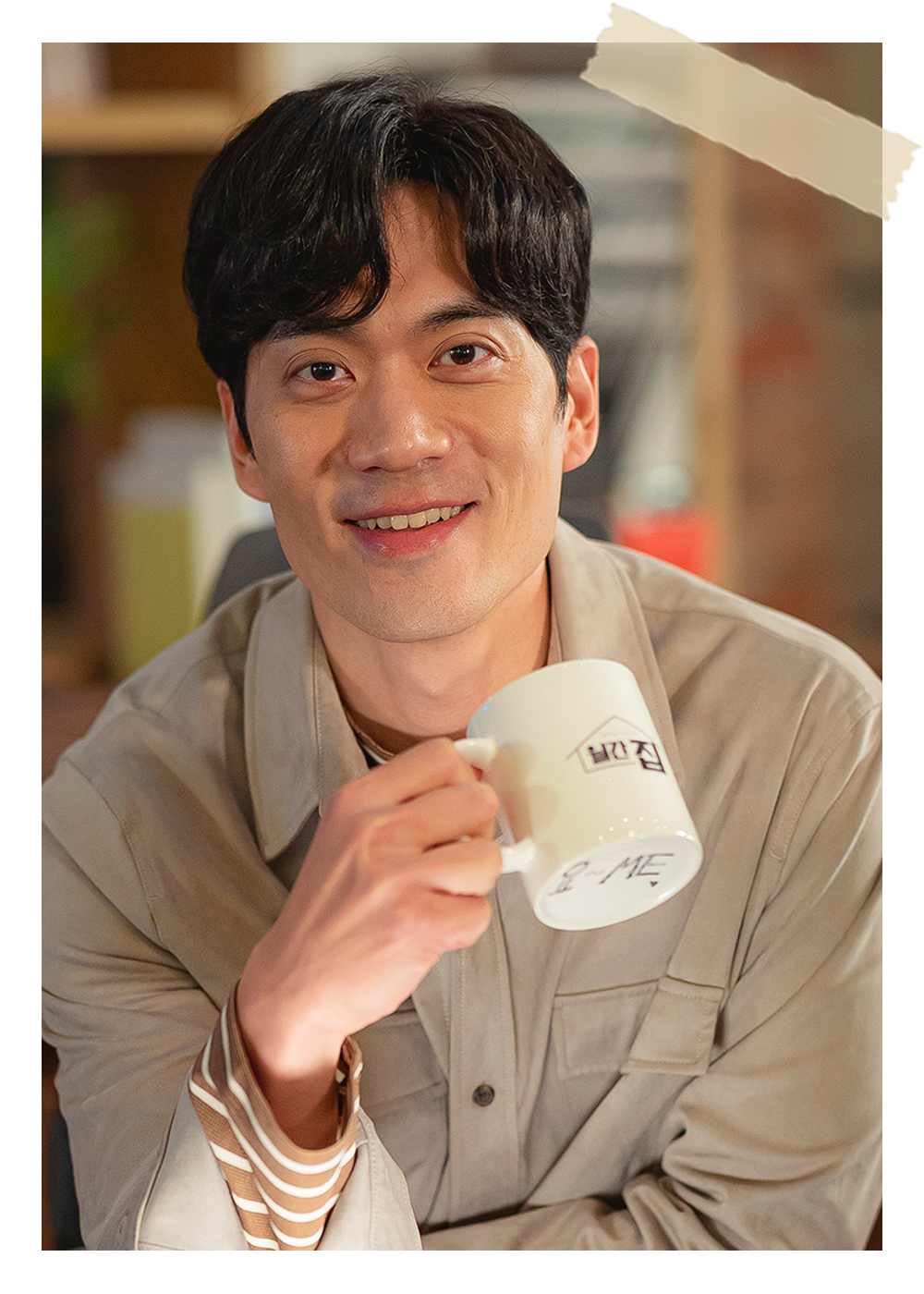
반면 청약 조울증을 앓고 있는 캥거루족 남상순(안창환 분)도 있습니다. 여의주와 같이 에디터 13년 차인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을 결혼의 필수품으로 믿고 계속해서 청약을 꿈꾸고 있지요. 결혼을 위해서 청약을 받아야 하는데, 그의 신념이 깨진 것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발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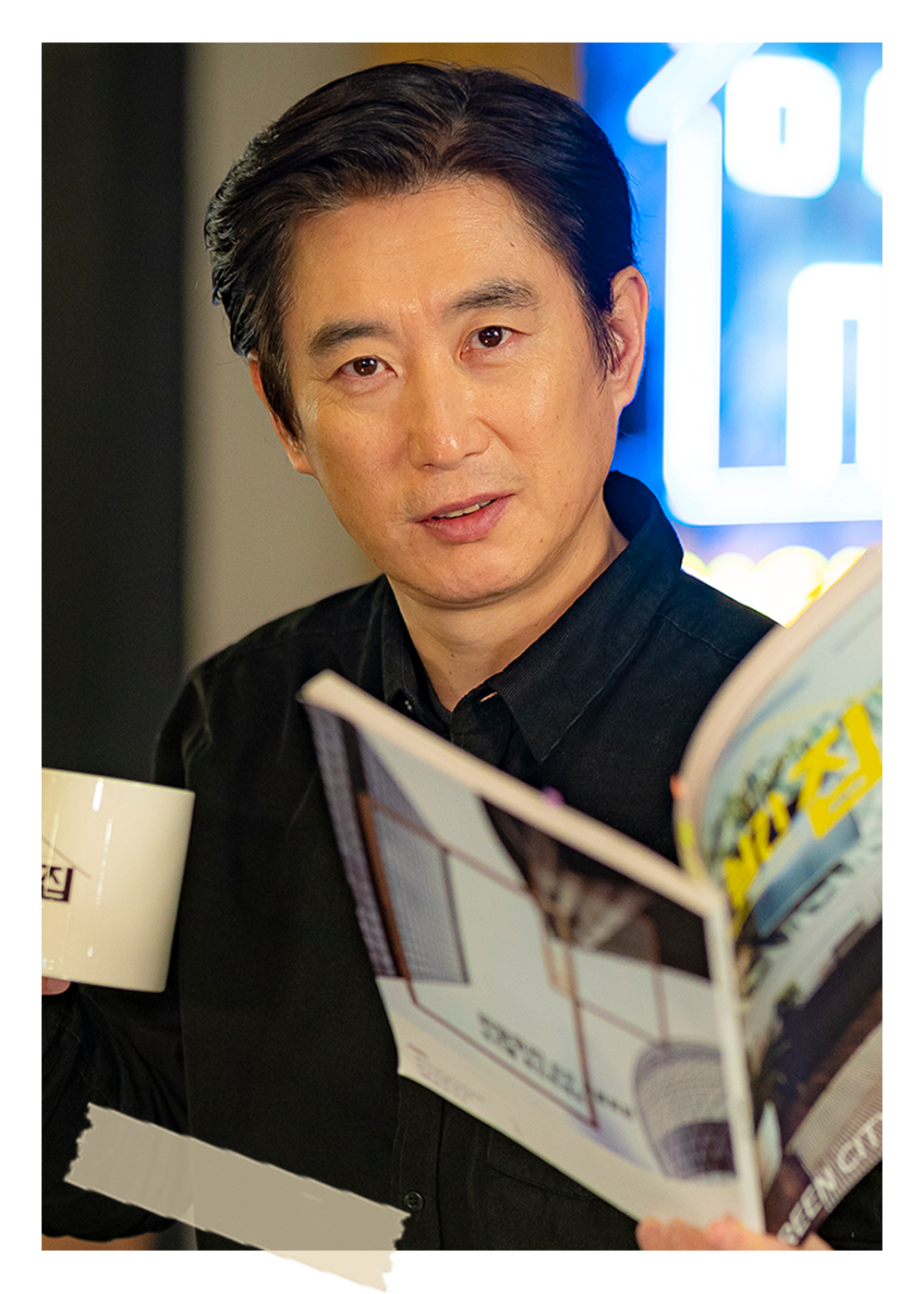
똘똘한 1채에 목을 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월간 집> 편집장 최고(김원해)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30년 된 아파트가 똘똘한 1채로 탈바꿈되는 재건축 호재만 바라보고 있는 그는 재건축 로또를 꿈꾸며 오래되어 불편한 아파트에서 한방을 노리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여러 등장인물들의 서로 다른 정의와 욕망들이 뒤섞여 드라마는 이어지는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집을 만들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집을 꿈꾸며 살고 있고, 또 살게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집을 철학하다’의 저자이며 건축 디자이너인 에드윈 헤스코트는 ‘집은 자신의 또 다른 인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문은 ‘삶을 담고 있는 액자’이며, 책은 ‘영혼이 있는 가구’, 거울은 ‘내면을 살피는 장치’이고, 바닥은 ‘우리 삶이 연출되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은 ‘더불어 어울려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며, 거실은 ‘집의 얼굴’이고, 복도는 ‘바쁜 이들을 위한 삶의 쉼표’라 설명합니다.
<월간 집>을 통해 나의 생활과 생각, 그리고 나의 인격과 만나는 재미난 시간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거 역사와 건강
· 내용상 오류나 저작권에 관련한 문의,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h_h-2021@kakao.com 로 연락 주세요.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저작권에 충돌되는 이미지나 내용 등은 위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집을 철학하다, 에드윈 헤스코트, 박근재 역, 2015 아날로그.
parkjh.khan.kr/entry/%EB%95%85%ED%88%AC%EA%B8%B0%EC%9D%98-%EC%97%AD%EC%82%AC
'미디어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화재를 몰고 나타난 드라마 - 간 떨어지는 동거 (0) | 2021.05.27 |
|---|---|
| 쿨내나는 로코버전 전설의 고향 – 간 떨어지는 동거 (0) | 2021.05.27 |
| 행복 망치기 프로젝트 - 목표가 생겼다 (0) | 2021.05.20 |
| 팔색조 매력을 뽐내는 마리아~~~ 오케이 광자매 (0) | 2021.05.19 |
| 오케이 광자매 – 비슷하지만 다른 나만의 인생 (0) | 2021.05.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