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톰 크루즈, 더스틴 호프만 주연 레인맨(1989), 주원과 문채원의 굿닥터(2013), 조승우 주연의 말아톤 (2001). 이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발달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습니다. 이 중 말아톤은 실재 인물인 자폐성 장애인 마라토너 배형진 씨를 모델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배형진 씨는 자폐를 딛고 2001년 춘천 마라톤을 완주했고, 2002년에는 최연소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또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해 봅니다.
발달장애 자폐 스펙트럼 Autism Spectrum Disorder라는 이름은 어떻게 태어났나요?

자폐 또는 자폐증 Autism은 발달 장애의 일종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제한적이고 반복적 행동을 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증상에 ‚자폐‘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은 1912년 미국 정신과 의사 ‚오이겐 블로일러(Eugen Bleuler) ‘로 처음에는 정신분열증 추가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폐‘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레오 카너 Leo Kanner는 1943년에 자폐 장애를 정신의학적으로 처음 분류하여 ‚조기 영아 자폐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오스트리아의 한스 아스퍼거는 언어나 인지발달은 문제가 없으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결함을 보이는 아이들을 발견하였는데, 후일 이러한 증상을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블로일러 자폐증은 100여 년 간 아동정신분열증과 혼선을 빚었는데, 2013년 미국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 분류체계인 DSM-5를 기준으로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로 통합되었습니다.
자폐를 가진 아동들은 그 특성과 나타나는 증후군들이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마치 프리즘을 통해 햇빛을 볼 때 태양의 빛이 다양하게 펼쳐져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폐+스펙트럼의 조합으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1981년 영국의 정신과 의사 로나 윙 Lorna Wing이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DSM이 뭐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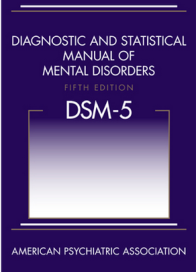
DSM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은 미국정신의학협회에서 발간하는 정신장애진단 통계 편람으로 정신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진단 매뉴얼입니다.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자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년-1939년) 이후 여러 나라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미국의 오이겐 블로일러나 영국의 리오 칸너, 또는 오스트리아의 한스 아스퍼거 같은 정신과 의사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름을 딴 병명을 만들거나 각자의 체계로 정신질환이나 행동장애들을 연구하고 분류하였습니다.
이렇게 밝혀진 많은 정신병들에 대해서 통계를 구하고 정식 질병으로 구분하려는 시도가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진행되었는데, 문제는 병으로 구분하기 힘든 환자들이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입니다.
결국 1952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을 발간하여 가벼운 정신질환들을 분류하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줄여서 DSM, 또는 DSM 분류라고 부르는데, 이 이 분류 기준은 이후 1952년 2판, 1980년 DSM-3을 거쳐 1994년 297개의 정신질환을 수록한 DSM-4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42년 동안 192개의 질환이 추가된 것이지요.
이 DSM-4에는 자폐성 장애가 아스퍼거 장애, 비전형 자폐, 제트 장애, 소아기 붕괴성 장애와 함께 ‚전반적 발달장애 PDD‘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버전인 2013년 DSM-5에서는 ‚전반적 발달장애‘라는 용어나 이 장애에 속했던 여러 가지 진단 분류를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통일되어 분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DSM-5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외에도 소아에서의 발작적 짜증을 ‚파탄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로, 노화로 인한 건망증을 ‚약한 신경 인지 장애‘로, 그리고 폭식 장애, 서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월경 전 불쾌감 장애, 행동 중독 등에 대한 새로운 장애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물론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도 국제 질병분류 ICD를 발간합니다. DSM이 정신질환에 집중한 분류체계라면 ICD는 모든 질병, 즉 정신 및 행동 장애에 대한 모든 질병을 F00~F99로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1952년 WHO의 기준에 따라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를 제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7차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WHO, 두 기관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분류 방법으로 질병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는 서로 간 변화에 대해 평가와 반영 등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등등 너무 용어들이 혼란스러워요

‚자폐 스펙트럼‘의 역사에서 보듯이 1912년 ‚자폐‘라는 단어가 처음 출연한 이후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자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정리되었던 많은 정신 및 행동 장애들이 1950년대부터는 분류가 되고 통합적인 연구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전 까지만 해도 자폐성 장애는 ‚전반적 발달장애‘라는 대분류 속에 아스퍼거 장애, 비전형 자폐, 제트 장애, 소아기 붕괴성 장애 등과 함께 다른 장애로 분류되었습니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분야, 또는 뇌 과학 등의 분야가 발달되며 새로운 발견이나 인과관계 등이 밝혀지면서 2013년부터는 이 모든 장애들을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통합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증상

이 발달장애는 생후 36개월 이전에 크게 아래 네 가지의 공통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 사회적 상호작용 부족
- 사회적 의사소통 부족
- 놀이 혹은 친구관계 부족
-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 또는 활동
보통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는 80% 정도가 지적장애를 보이고, 25%가 뇌전증(간질), 그리고 80% 이상이 수면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식이장애나 우울증, 불안, 또는 프레자일 X 증후군 등도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 사회적 상호작용 부족
사회적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감정교환이 있어야 하는데, 자폐는 이렇게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며 아래와 같은 반응을 나타낸다.
- 눈을 맞추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는다.
- 또래 아이들이나 부모의 감정표현에 반응하지 않는다.
-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어려워한다.
2) 사회적 의사소통 부족
자폐 아동은 지능과 상관없이 의사소통에 관심이 없다. 주로 타인의 말을 따라만 하거나 혼자 중얼거리고, 또는 자신이 한 말의 일부를 계속 반복한다.
3) 놀이 혹은 친구관계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행동을 하지 못하여 친구 맺기에 어려움이 있다.
4)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관심 또는 행동
자폐 아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자신과 다른 또래와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이나 관심, 활동에 있어 제한된 반복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DSM-5에서 분류 기준으로 제시한 반복 행동이나 관심 행동은 아래와 같다.
- 반복적인 신체동작, 반복적 사물 사용, 또는 반복적 말하기
- 일상적 패턴이나 의례적 활동을 융통성 없이 고수함
- 강도나 집중도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제한적임
- 고통, 온도, 불빛, 소리, 혹은 이 외의 감각 자극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둔감함, 혹은 과도하게 많거나 적은 관심을 보임
자폐 스펙트럼의 원인

자폐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는 모든 전문가들의 궁금증이었고, 이 궁금증에 나름대로의 가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 영아 자폐증‘을 처음 정신의학적으로 분류하였던 레오 카너는 1943년 ‚조기 영아 자폐증‘이라는 논문에서 자폐증의 원인을 부모의 애정 부족이라고 보고 자폐증 아이의 엄마를 애정 없는 차가운 엄마라는 뜻으로 ‚냉장고 엄마‘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정을 갖고 양육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카너의 분석이 미국 자폐증 학회의 정설로 여겨지던 60년대 영국의 마이클 러터 Michael Rutter는 ‚자폐증은 선천성 뇌장애‘라는 가설을 발표합니다.
유전학의 발달과 정신과학 및 뇌과학이 발달한 현대에는 카너의 분석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신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가능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대한 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밝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전적 용인
현재 가장 관심을 갖고 집중하는 자폐의 원인은 ‚유전자적 영향‘입니다.
최근 미국 존 콘스탄티노 박사 연구팀에 따르면 부모의 형제자매 중 자폐증 환자가 있는 아이의 자폐증 진단율이 3-5%로 다른 일반 아이들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유전율이 약 80%로 알려졌는데, 이는 일란성쌍둥이가 이란성쌍둥이보다 공병률이 약 7-9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뇌 기능 이상
사회적인 지각과 관련되는 사회적 뇌(social brain)는 다른 사람의 행동, 의도, 심리 상태와 성향을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뇌 기능의 이상이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3) 환경 요인
주산기감염, 조산이나 둔위 분만, 저출생체중아, 출생 시 호흡기 부전, 고연령 임신, 환경오염 물질, 중금속 등의 다양한 환경 요인도 자폐스펙트럼 장애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약 6700만 명의 사람들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가 2018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59명 당 1명꼴로 ASD 진단을 받아 2012년 대비 15%가 증가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약 5배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경우 2011년 미국 예일대 김영신 교수팀이 고양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병률이 2.6%, 38명에 한 명으로 보고되어 심각성을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장애가 그렇듯 자폐스펙트럼 장애도 치료되는 장애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진단을 받아 체계적인 특수교육과 행동치료를 받는다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져 자기 주도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발달장애와 이에 따른 정신증 기분장애 및 행동장애에 대한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자폐에 대한 병적 이해뿐 아니라 자녀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자폐아가 자기 주도적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치료를 겸하고는 있지만 약물치료와 이렇게 별도 특수 교육프로그램, 또는 행동 및 심리, 언어 치료 등 개별적 특성에 맞는 개별 맞춤 프로그램 등과 병행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2세 이하 때 진단받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일반적인 아이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웃거나 즐거워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부모님과 눈을 맞추지 않는 등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옹알이를 하지 않거나 18개월 차에도 말을 하지 못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행동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기는 하지만 자폐아들은 다른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학습하거나 전문가적 소질을 보여주기도 하고, 정직히 확고한 의지로 자신의 원하는 것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뇌신경학자 올리버 색스 연구에 따르면 일부 자폐아는 돼지 울음소리를 듣고 단번에 그 음계를 맞추거나, 바닥에 쏟은 수백 개의 콩알이 몇 개인지 정확히 세는 등 뛰어난 청각 및 시각 능력을 지녔다고 합니다.
자폐를 가진 아이가 자신의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찾아 나간다면 자폐아들도 자신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와 건강
참고자료:
www.autismpartnershipkr.com/ko/about-autism/cause-prevalence-prognosis-and-recovery/
www.mentalhealth.go.kr/portal/disease/diseaseDetail.do?dissId=14
www.g-health.kr/mobile/bbs/selectBoardArticle.do?bbsId=U00186&nttId=411615&lang=&searchCndSj=&searchCndCt=&searchWrd=&pageIndex=1&vType=
www.cdc.gov/mmwr/volumes/67/ss/ss6706a1.htm
en.wikipedia.org/wiki/Autism_spectrum
· 내용상 오류나 저작권에 관련한 문의,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h_h-2021@kakao.com 로 연락 주세요.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합니다. 저작권에 충돌되는 이미지나 내용 등은 위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함께 공부하는 심리학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짜 웃음 vs. 가짜 웃음 (0) | 2021.06.16 |
|---|---|
|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 샤덴프로이데 (0) | 2021.06.15 |
|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s Syndrome (0) | 2021.04.25 |
| 자폐 스펙트럼이란? (0) | 2021.04.25 |
| 가르시아 효과 Garcia Effect (맛-혐오 학습Taste-Aversion Learning) (0) | 2021.04.19 |




댓글